상상해보자. 턱수염을 기른 거구의 남자가 망토 같은 작업복을 입고, 옆엔 드레스를 입은 여인이 함께 걷는 모습을. 19세기 말 아터제 호숫가 주민들 눈에 비친 구스타프 클림트(1862~1918)와 그의 파트너이자 뮤즈였던 패션 디자이너 에밀리 플뢰게 모습이다.
오스트리아의 자랑, 세계가 사랑하는 구스타프 클림트. 이름만 들어도 황금빛 키스로 유명하지만 실은 꽃과 나무를 사랑한 자연주의자였다. 빈의 번잡함을 벗어나 그가 찾은 휴식처, 바로 오스트리아 아터제 호수다.
|
Point 01. 클림트는 왜 아터제로 갔나
|
클림트는 재능 있고 부지런한 화가였다. 14세부터 미술 교육을 받은 클림트는 빈에서 일찍이 스타덤에 올랐다. 부자들 초상화 한 장이 집 한 채 값이었으니, 말 그대로 ‘돈방석’에 앉은 셈. 클림트는 반항아였다. 1897년, 클림트는 ‘빈 분리파’라는 예술 반란군을 결성했다. 전통과 아카데미를 거부하고 ‘시대마다 예술을, 예술에 자유를’이란 모토를 내걸었다. 아르누보 영향을 받은 그의 화려하고 장식적인 스타일, 특히 여성 누드화는 당시 보수적인 빈 사회에 충격을 줬다.
클림트 붓끝은 황금빛이었다. 부유층 초상화로 돈방석에 앉은 그는, 빈 사회 트렌드를 캔버스에 옮겼다. 급격한 기술 발전과 사회 변화 한가운데서, 그는 시대를 그림에 담아냈다. 당시 빈은 유대인들의 새로운 보금자리였다. 그들은 비즈니스 수완으로 중상류층에 진입해 빈 사회 엘리트로 떠올랐다. 부와 지위를 과시하고 싶어 하는 그들에게 클림트의 초상화는 필수 아이템이었다.
클림트 경력의 큰 전환점은 빈 대학 천장화 사건이었다. 철학, 법학, 의학을 주제로 한 그의 그림은 모두의 기대와는 달랐다. 전통적인 알레고리(우화적 표현) 대신 누드화로 가득했다. 결과는 대 스캔들. 의회까지 나서서 비난했다. 1900년 파리 만국박람회에서 금메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빈에서는 대중과 정치인의 거센 비난을 받았다.
결국 클림트는 자신의 작품을 되사고, 더 이상 공식 의뢰를 받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이미 충분한 부를 쌓은 그에겐 의뢰가 필요 없었다.
클림트는 빈 예술계의 혁명가였다. 예술가들에게 고유의 표현법을 찾으라고 독려했고, 사진 기술 발달로 더욱 창의적인 표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스캔들과 비난에 지친 클림트 눈에 들어온 곳이 아터제 호수였다. 혼란을 벗어나 평화를 찾고자 했다. 호숫가에서 클림트는 완전히 다른 화풍을 보여줬다. 누드 대신 나무를, 황금빛 장식 대신 맑은 호수를 그렸다. 전쟁이나 사회 문제 대신 자연에만 집중했다.
|
Point 02. 클림트 정원에서 피어난 예술
|
클림트에게 아터제는 휴양지이자 영감의 원천이었다. 도시의 정돈된 꽃밭과 달리, 아터제 자연은 무한한 영감의 보고였다.
클림트는 1900년 첫 방문 이후, 매년 여름을 아터제에서 보냈다. 특히 1910년부터 1916년까지 7년간은 거의 상주하다시피 했다. 아터제에서 그린 풍경화만 40여점. 제2의 스튜디오나 다름없었다. 그의 전체 풍경화 작품 중 대부분을 차지한다.
아터제 호수 주변에 2003년 ‘예술가의 길’이란 산책로가 조성됐다. 클림트 세계관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다. 2012년에는 구스타프 클림트 센터도 문을 열었다. 센터 근처의 클림트 정원은 또 다른 볼거리.
약 100㎡의 아담한 정원은 네모난 화단, 수련 연못, 장미 울타리로 꾸며졌다. 1907년부터 1916년 사이 클림트가 그린 6개의 그림에서 모티브를 얻었다. ‘시골집 정원(Cottage Garden)’ ‘해바라기가 있는 시골집 정원(Cottage Garden with Sunflowers)’ ‘장미 정원(Rose Garden)’ ‘십자가가 있는 시골집 정원(Cottage Garden with Crucifix)’ ‘이탈리아 정원 풍경(Italian Garden Landscape)’ ‘닭이 있는 정원 길(Garden Path with Chickens)’ 등이 바로 그 작품들이다.
클림트의 아터제 사랑은 그의 편지에서 생생히 드러난다. 빈에서 작업하던 그는 잘츠캄머구트 지역에 먼저 가 있던 에밀리 플뢰게와 지인들에게 아터제에 대한 그리움이 담긴 편지를 보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여길 벗어나고 싶어졌어”라는 구절은 그의 마음을 보여준다.
염원하던 잘츠캄머구트에 도착한 클림트는 오자마자 이젤을 세워 그림을 그렸을 정도다. 클림트는 하루도 쉬지 않고 작업에 몰두했다. 빌라 폴릭과 보트하우스는 그가 유독 아꼈던 장소로, 종종 호수 건너편에서 직접 노를 저어 찾아오곤 했다. 지금도 거의 원형 그대로 남아있다.
부두에서 망원경을 들고 있는 클림트 모습은 유명하다. 아마 그 망원경으로 새로운 풍경을 찾아 헤맸을지도.
호수의 고요함은 클림트 마음에 평화를, 빛깔과 색채는 영감을 선사했다. 클림트의 붓은 대자연의 웅장함뿐 아니라 일상의 소소한 아름다움도 놓치지 않았다.
눈길을 끄는 건 클림트 그림 속 꽃들이다. 봄과 여름꽃이 한 화폭에 공존한다. 해바라기, 달리아, 장미, 양귀비가 한데 어우러진 모습, 실제로는 불가능하지만 그의 그림 속에선 가능했다.
재미있는 건, 그림이 대부분 정사각형 캔버스에 담겼다는 점이다. 마치 SNS 인스타그램 필터를 미리 본 것 같다. 역시 시대를 앞서간 사람이다. 클림트 시선으로 사진을 남기고 싶다면 정원에 있는 정사각형 설치물을 이용하면 된다. 아터제를 찾는다면, 클림트 발자취를 따라 천천히 걸어보자.
권효정 여행+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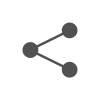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