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에도 불구하고 격한 몸싸움을 포함한 ‘알몸 축제’를 강행해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지난 20일 일본 오카야마시 히가시구의 사이다이지 관음원에서 ‘하다카 마쓰리’로 불리는 알몸 축제가 열렸다.
이 축제는 무로마치 시대부터 500년간 매년 2월 셋째 주 토요일 밤마다 열린다. 수확, 번영, 풍요를 기원하는 이 축제는 국가 중요 무형 민속 문화재로 지정될 만큼 일본 3대 축제 중 하나로 꼽힌다.
문제는 이 행사의 상당 부분이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 세계가 코로나19 종식을 기원하며 백신 접종을 서두르는 상황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축제에서 남성들은 달리기로 몸을 풀고, 차가운 분수대에서 몸을 씻은 뒤 좁은 장소에서 ‘호기’라고 불리는 부적을 차지하려고 경쟁한다. 이 부적은 지름 4cm, 길이 20cm의 나무 막대기로, 1년 동안 행운을 가져다줄 힘이 깃들었다고 여겨진다. 참가자들은 30분간 격한 몸싸움을 벌여 호기를 쟁취하려고 안간힘을 쓴다.
‘알몸 축제’라는 이름과 달리 남성들은 훈도시(전통 속옷)를 걸쳐 중요 부위는 가리고 참여한다.

많은 사람이 몰리는 축제 특성상 참가자 가운데 코로나19 확진자가 있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시켜 감염자가 대폭 증가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하지만 주최 측은 “500년 동안 이어진 축제를 중단할 수 없다”면서 규모를 대폭 축소하고 프로그램을 바꾸면서까지 개최를 강행했다.
참가자가 1만 명이었던 작년과 달리 올해 축제엔 100명 정도만 참여했다. 호기 쟁탈전은 코로나19의 종식과 세계 평화, 다산을 기원하는 행사로 대체했으며 관람객 없이 비공개로 진행됐다.

주최 측은 코로나19 시국에 축제를 개최하는 것에 대해 “관계자들과 협의해 ‘지금이야말로 축제의 기도가 필요한 때’라고 판단했다.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축제의 진수를 잃지 않을 방법을 모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세계 각국이 학교 졸업식과 입학식을 포함한 모든 일상 활동을 자제하는 상황에서 이같은 축제 강행이 바람직했는지를 두고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강예신 여행+ 인턴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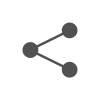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