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도 원주 시내에서도 차로 약 30분을 더 달려 들어가야 하는 수래봉 자락에는 보물 같은 공간이 숨어 있다. 올해로 개관 10주년을 맞이한 뮤지엄산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유명한 일본 건축가 안도 다다오(安藤忠雄)가 설계한 이곳은 개관 이후 한 해도 빠짐없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하는 ‘한국관광 100선’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위치만 놓고 보면 이 먼 곳까지 찾아갈 사람이 얼마나 될까 싶지만,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는 한국관광 데이터랩에 따르면 해마다 2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발길을 옮긴다. 성인기준 입장료가 기본 2만2000원부터 시작한다는 점을 생각하면 더욱 고무적인 수치다.
루브르 박물관(Musée du Louvre)의 모나리자(Monna Lisa), 뉴욕 현대미술관(MoMA)의 별이 빛나는 밤(De Sterrennacht)처럼 유명한 미술관, 박물관의 명성에서 그들이 소장한 작품의 이름값이 차지하는 부분은 분명 무시할 수 없다. 하지만 뮤지엄산은 다르다. ‘안도 다다오의 건축’, 그 한 가지가 무엇보다 매력적인 콘텐츠가 되고 예술이 되어 사람들을 불러모은다. 원주를 넘어 강원도의 대표 미술관으로 자리매김한 뮤지엄 산의 모습을 여행플러스가 담았다.
|
풀, 물, 돌…야외를 수놓은 정원들 |
뮤지엄 산에는 총 세 개의 정원이 있다. 본관으로 이동하며 만나게 되는 플라워가든과 워터 가든, 본관 뒤로 펼쳐지는 스톤가든이다.
흔히 세간에서 안도 다다오의 건축적 특징 중 하나로 ‘이용자 체험을 중시하는 동선 설계’를 많이 꼽는다. 플라워가든과 워터가든은 그 동선 설계의 일환으로, 말하자면 뮤지엄 산이라는 작품은 이미 이곳에서 시작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먼저 플라워가든에 들어서면 길게 뻗은 회색 길 양쪽으로 푸르른 밭이 펼쳐진다. 플라워가든에 왜 꽃이 없는지 의아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양쪽의 밭에는 붉은 패랭이꽃 80만 본을 심어뒀다. 만개 시기인 5월에 오면 이름에 부합하는 화려한 꽃동산으로 탈바꿈한다.
우측에는 마크 디 수베로(Marco di Suvero)의 조각 작품 ‘제라드 멘리 홉킨스를 위하여(For Gerard Manley Hopkins)’가 설치되어 있다. 강렬한 붉은색이 시선을 끄는 거대한 철제 조각품은 그 아래 깔린 풀의 색과 대비되며 방문자들의 눈길을 끈다. 제라드 맨리 홉킨스의 시에 등장하는 황조롱이에서 영감을 받은 작품으로 바람이 강할 때면 거대한 강철의 동체가 새가 날갯짓하듯 조금씩 움직인다.
꽃밭을 지나 하얀 자작나무 숲까지 통과하면 낮은 콘크리트 담장이 정면 시야를 막는다. 그 너머로 붉은색 조각 작품과 본관이 살짝 모습을 드러내 기대감을 높인다.
콘크리트 담장이 계속 본관 쪽 시야를 막고 있으므로 마침내 길이 꺾이고 워터가든이 모습을 드러내면 극적인 감동을 느낄 수 있다. 뮤지엄 산의 상징과도 같은 설치미술 작품 아치웨이(Archway)와 본관 건물이 호수처럼 고요한 물 위에 떠 있는 듯한 신비로운 모습에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발길을 멈추고 사진을 찍기 바쁘다.
워터가든의 물은 본관을 둘러싸듯 뒤쪽까지 이어진다. 본관 내부 곳곳에 뚫어둔 낮은 창이나 카페의 야외 테라스 등에서 그 모습을 계속 확인할 수 있다. 겨울 동안 안전상 이유로 물을 빼면 평소 가라앉아 보이지 않는 자갈이 드러나 또 다른 매력을 뽐낸다.
마지막 정원인 스톤가든에서는 경주 고분에서 착안했다는 9개의 돌무더기를 볼 수 있다. 안도 다다오는 올해 4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일본이 나무의 문화라면 한국은 돌의 문화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힌 바 있다. 그 말처럼 이곳은 비록 우리에게 익숙한 한옥과는 결이 다를지언정 소나무, 돌, 하늘과 바람이 조화를 이루는 지극히 한국적인 장소다.
|
본관, 뮤지엄산의 꽃 |
안도 다다오의 작품이라는 말에 본관을 노출콘크리트 일색의 회색 건물로 생각했다면 큰 오산이다. 밖에서 바라본 본관의 모습은 콘크리트보다는 석재, 그중에서도 파주에서 공수해온 이른바 ‘파주석’이 돋보인다.
그렇다고 노출콘크리트가 빠졌느냐고 묻는다면 그건 아니다. 실내로 들어가면 복도의 벽과 기둥 곳곳 노출콘크리트의 향연이다. 재미있는 건 콘크리트의 촉감이다. 사포, 못해도 쪼개진 자연석 단면같이 거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뮤지엄 산에서 만난 콘크리트의 표면은 대리석처럼 매끄럽고 광택까지 난다.
플라워가든, 워터가든과 마찬가지로 본관 실내에서도 잘 짜인 이동 동선은 빛을 발한다. 복도와 계단, 어느 곳이건 그냥 지나치기 아깝다. 특히 건물 중앙에 있는 삼각 코트(Triangular Court)가 인상적이다. 이름처럼 뻥 뚫린 삼각형 중정인 이곳은 사람들이 잠시 외부로 나가 하늘을 바라볼 수 있다. 중정을 둘러싼 실내 공간은 전부 계단이 아닌 경사로로 이동하게 되어있으며 중정 방향 벽에는 딱 눈높이 정도에 슬릿 창을 내 밖을 엿보도록 설계했다.
한편 메인이라 할 수 있는 기획전시실에 집중해서 놓치기 쉬운 상설전시실 종이박물관도 꼭 들러보자. 실제 파피루스가 자라는 파피루스 온실, 종이의 역사와 기원 등을 알 수 있는 2개의 전시실로 구성되어 있다. 전시 자체도 물론 훌륭하지만, 기획전시실과는 사뭇 다른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 좋다. 특히 전시실로 향하는 계단 앞 복도에는 사람들이 앉아 낮은 창으로 수면에 비친 풍경을 감상하곤 한다.
|
그야말로 화룡점정, 제임스터렐관 & 명상관 |
뮤지엄 산은 본관 외에 두 개의 체험시설을 운영한다. 역시나 모두 안도 다다오의 작품이다. 하나는 미국의 시각예술가 제임스 터렐(James Turrell)의 작품만을 위해 고안한 전시관 제임스터렐관, 다른 하나는 2018년 개관 5주년을 맞아 지은 명상관이다. 두 시설 모두 표를 구매할 때 추가금을 내고 방문 예약을 해야 들어갈 수 있으며 내부 사진 촬영을 금지한다.
이날 제임스터렐관에서 만난 작품은 스페이스 디비전(Space Division), 간츠펠트(Ganzfeld), 웨지워크(Wedgework) 세 가지다. 스페이스 디비전은 비가 올 때만 볼 수 있는 작품으로 타원형 공간에서 100가지 색이 번갈아 가며 서서히 천장을 물들이는 것을 바라보며 사색을 즐길 수 있다.
두 번째 작품 간츠펠트는 더욱 강렬하다. 시각 자극을 박탈했을 때 환각을 보는 현상의 이름을 딴 이 작품은 우리가 눈으로 보고 인지하는 것들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킨다. 바깥에서 볼 때는 평면 스크린인 줄 알았던 원색의 사각형은 사실 다른 공간으로 들어가는 입구다. 검은 계단을 올라 안쪽으로 들어가면 그야말로 무한한 공간이 펼쳐지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 거기에 방금 전까지 하얀색이던 바깥 공간이 내부 조명의 보색으로 보이기까지 한다. 지극히 단순한 구조로 이토록 복잡한 효과를 만들어낸 작가의 발상이 감탄을 부른다.
마지막 작품 웨지워크에는 컴컴한 복도에서 겁에 질려 있던 자신에게 문틈 사이로 삐져나온 얇은 빛이 한 줄기 희망으로 다가왔던 작가의 어린 시절 기억이 녹아있다. 수많은 색의 변화가 돋보이는 앞선 두 작품과 달리 빛의 삼원색인 빨강, 파랑, 초록 조명만을 사용했지만, 작품의 인상은 못지않게 강렬하다.
사실 이렇게나 구구절절한 설명도 이곳을 묘사하기엔 부족하기 그지없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마치 이곳을 위해 존재하는 것 같다. 관람 시간은 30분에 지나지 않으나 그 여운의 깊이는 대단하다. 다소 과감하게는 뮤지엄 산에 와서 제임스터렐관을 들리지 않는다면 절반은 손해를 본다 할 수 있으니 꼭 들르길 권한다. 단, 실내가 매우 어둡기 때문에 폐소공포증이 있거나, 시력에 문제가 있는 경우엔 방문을 삼가는 게 좋다.
한편 스톤가든에서 오른쪽으로 내려가면 2018년 개관 5주년을 기념해 건설한 명상관이 있다. 전체적인 외관이 스톤가든의 돌무더기들과 흡사하나 중앙을 가르는 슬릿 창이 나 있는 점이 다르다. 내부로 들어가니 바깥의 돌무더기의 원형이 경주의 고분이라는 이야기를 다시금 실감했다. 이곳에서 방문자들은 시간에 따라 5가지의 명상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방문 당시 체험했던 쉼 명상은 호흡과 이완을 통해 일상에서 쌓인 몸과 마음의 긴장을 내려놓는 시간을 갖는다. 길지 않은 시간이었음에도 금방 몰입해 피로와 스트레스를 덜어낼 수 있었다. 함께 참가한 몇몇은 중간부터 잠에 빠져들기도 했다. 공간의 분위기며 프로그램까지, 안도 다다오가 뮤지엄 산에 담고자 했던 ‘새로운 자신을 발견해 살아갈 힘을 찾는 장소’라는 의미를 이보다 더 잘 녹여낸 공간은 없을 것이다.
글, 사진=강유진 여행+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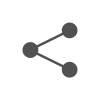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