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리는 잘 못하지만 요리책 보는 것은 좋아한다. 요리책을 읽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오감이 열린다.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설명을 눈으로 따라 읽고 완성된 음식 사진에 다다르는 동안 머리로는 음식의 맛을 상상하고 직접 만들어보는 시뮬레이션까지 마친다.
요즘 요리책은 더 재밌다. 음식에 추억을 덧댔다. 음식과 관련한 소소한 이야기를 곁들여 잔잔한 울림을 준다. 여행, 책 그리고 맛있는 음식. 인생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즐거움 세 가지가 재밌게 상호작용하는 책 두 권을 선물 받았다. 한 권은 제주에서 업으로 요리를 하며 느낀 이야기를 풀어낸 ‘이꼬이에 놀러 왔어요’, 다른 하나는 요리 하나에 인생 에피소드 하나씩 펼친 ‘식탁 위의 작은 순간들’이다.
10년 치 방명록에서 시작한
‘이꼬이에 놀러 왔어요’
정지원 셰프를 알게 된 것은 10여 년 전이었다. 당시 그가 이촌종합시장에서 운영하던 식당 ‘이꼬이’는 기자와 홍보 담당자들 사이에서 핫한 가게였다. 일본 가정요리를 안주로 밤새 내내 술을 마시는 ‘심야식당’ 컨셉으로 인기를 끌었다. 이꼬이 덕분에 주변 시장 상권이 살아났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였다.
2014년 정 셰프는 별안간 제주로 내려가 숙박업을 시작했다. 아무런 연고도 없이 제주로 내려온 건 순전히 제주가 좋아서였다. 2007년 제주올레를 걸으면서 제주에서 딱 10년만 살아보자는 계획을 세웠다. 본래 계획대로라면 45살이 되던 해, 2018년에 제주 생활을 시작했어야 했다. 계획을 4년이나 앞당긴 것은 눈여겨 봤던 건물이 매물로 나왔기 때문이다. 그렇게 덜컥 사들인 것이 제주시 구도심에 위치한 이꼬이앤스테이 건물이다.
10년만 살아보자고 했던 마음은 지금 어떻게 변했을까. 궁금한 마음으로 ‘이꼬이에 놀러 왔어요’ 첫 장을 열었다. ‘이꼬이에 놀러 왔어요’는 이꼬이앤스테이 1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발간한 요리책이자 그간 이꼬이앤스테이를 찾아준 손님에게 보내는 헌사 같았다. 정 셰프는 프롤로그에서 “10년쯤 되면 방명록을 엮어서 책을 내고 싶다는 생각을 막연히 했었다”고 말한다. 8객실, 식당 하나 딸린 4층짜리 숙박업소를 혼자 운영하면서 그만두고 싶을 때마다 두꺼운 방명록을 펼쳐보며 힘을 얻었다.
‘이꼬이에 놀러 왔어요’는 총 5부로 이루어져 있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건 역시 조리법 소개다. 책 절반을 차지한다. 이꼬이앤스테이에서 10년 동안 차려낸 음식 중에 손님들이 가장 맛있게 먹었던 요리 61개를 다룬다. 간단한 밑반찬부터 오래 두고 먹을 수 있는 장아찌와 달콤한 제철 디저트 등 다양하다. 조리법이 어렵지 않아 쉽게 따라 해볼 수 있는 것들 위주다.
2부에서는 이꼬이앤스테이의 상징 ‘조식’에 대해 적었다. 정갈한 한상차림 사진은 물론 평소 정 셰프의 단골 가게 이야기도 만날 수 있다. 3부는 이꼬이앤스테이를 방문한 손님들의 이야기로 채웠다. 4부에서는 정 셰프가 추천하는 제주 맛집과 손님들이 방명록에 남긴 제주 명소를 소개한다.
가장 따뜻한 것은 맨 마지막에 있다. 10년간 쌓인 방명록 중에서 24가지를 골라 책에 실었다. 방송인 김나영부터 대만·미국·캐나다·홍콩 등 전 세계에서 이꼬이앤스테이를 찾아준 사람들이 남기고 간 짧은 이야기가 등장한다. 누구는 폴라로이드 사진으로 흔적을 남겼고, 누구는 그림도 그렸다. 정성스러운 손님들 사연 아래 정 셰프가 직접 단 답글도 인상적이다. 기억을 더듬어 손님과의 에피소드를 떠올려 정성스레 응답했다.
300페이지에 달하는 책을 다 읽고 났더니 어쩐지 든든한 느낌이 들었다. ‘이꼬이에서 아침밥을’ 위해 모인 사람들이 풀어낸 진정성 담긴 기록에서 훈훈한 밥 냄새가 느껴지는 듯했다.
추억이든 기억이든
‘식탁 위의 작은 순간들’
그런가 하면 ‘식탁 위의 작은 순간들’은 박준우 셰프의 인생 고백 같았다. 어린 시절 등 떠밀려 떠났던 낯선 유럽에서의 기억 혹은 추억을 담은 음식과 술에 대해 이야기한다. 목차는 생소한 음식으로 가득했다. ‘유럽의 사계절’을 테마로 36가지 요리를 선정했다.
봄·여름·가을·겨울, 각 계절 별로 유럽에서 구할 수 있는 식재료를 활용한 요리 9개씩을 소개한다. 봄 챕터는 화이트 아스파라거스와 달걀 소스로 시작해 허브 생치즈 스프레드, 달고기 스테이크와 바지락 소스, 연어 스테이크와 렌틸콩, 페스토 오레키에테, 로스트 치킨, 고수 커리 양고기 크로켓 그리고 딸기 타르트와 머랭 케이크로 마무리된다. 소개한 메뉴 중 몇개만 준비하면 우리 집에서도 근사한 코스 요리를 즐길 수 있을 것만 같았다. 아니, 이미 머릿속으로는 누구를 불러 요리를 대접할지 리스트를 뽑고 있었다. ‘이걸 직접 만들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기도 했지만 이미 늦었다. 뭐든 새롭게 시도해보기 좋은 계절 봄이니까, 들뜬 마음으로 책장을 넘겼다.
‘식탁 위의 작은 순간들’은 이전에 봤던 요리책과는 조금 달랐다. 음식에 관한 자신의 소회가 거의 절반 이상 차지한다. 가장 먼저 소개한 ‘화이트 아스파라거스와 달걀 소스’에서는 박준우 셰프가 왜 벨기에로 가야만 했는지에 대해서부터 시작한다. 할아버지의 사업이 망하고 아버지의 월급까지 연대보증으로 묶여버렸다. 그런 시기에 아버지가 주재원으로 파견 나가게 되면서 온 가족이 벨기에로 이주했다. 박준우 셰프는 이 일이 자기가 요리를 시작하게 된 계기였다고 말한다. 벨기에 생활을 막 시작하고는 마트에서 장 보는 일이 가장 즐거운 일상이었다. 화이트 아스파라거스는 박준우 셰프에게 ‘벨기에의 봄’을 일깨워주는 식재료다. 그는 봄에 유럽 출장 갈 일이 있으면 빼놓지 않고 화이트 아스파라거스 요리를 찾아 먹는다.
에피소드를 읽고 나니 셰프와 가까워진 기분이 든다. 다음 장을 넘기면 조리법이 나온다. 조리법 역시 여느 요리책과 다르다. 다른 요리책에서는 먼저 필요한 재료를 적고 최대한 간결한 문장으로 요리 순서에 따라 조리법을 열거하는데, 박준우 셰프는 정반대 방법을 택했다. 생소한 재료라서 그런지 손질법에 대해 상세히 적었다. 마지막은 요리에 어울리는 술을 추천한다. 와인을 알게 된 계기와 와인에 대한 단상 등 개인적인 이야기를 곁들인 것도 재밌다. (솔직히 요리 이야기보다 와인을 말할 때 더 신이 난 것처럼 느껴진다.)
개인적인 서사가 그득그득 묻어있는 36가지 요리와 술을 눈으로 먹고 마셨다. 지질한 기억도 시간이 버무려져 추억이 되고 농익은 추억은 어느덧 환상이 되어 있다. 이렇게 개인적인 요리책이라니, 너무 솔직 담백한 맛에 술이 당긴다. ‘파리 7구 한적한 골목 카페 테라스’를 떠올리게 하는 로제 스틸 와인이 좋을까, 이름부터 멋진 코르시카 섬의 파트리모니오 지역 화이트 와인이 좋을까. 어쩐지 주객이 전도된 것 같지만, 소개된 술을 더 맛있게 마시기 위해서라도 요리에 꼭 도전해봐야겠다.
홍지연 여행+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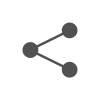
댓글0